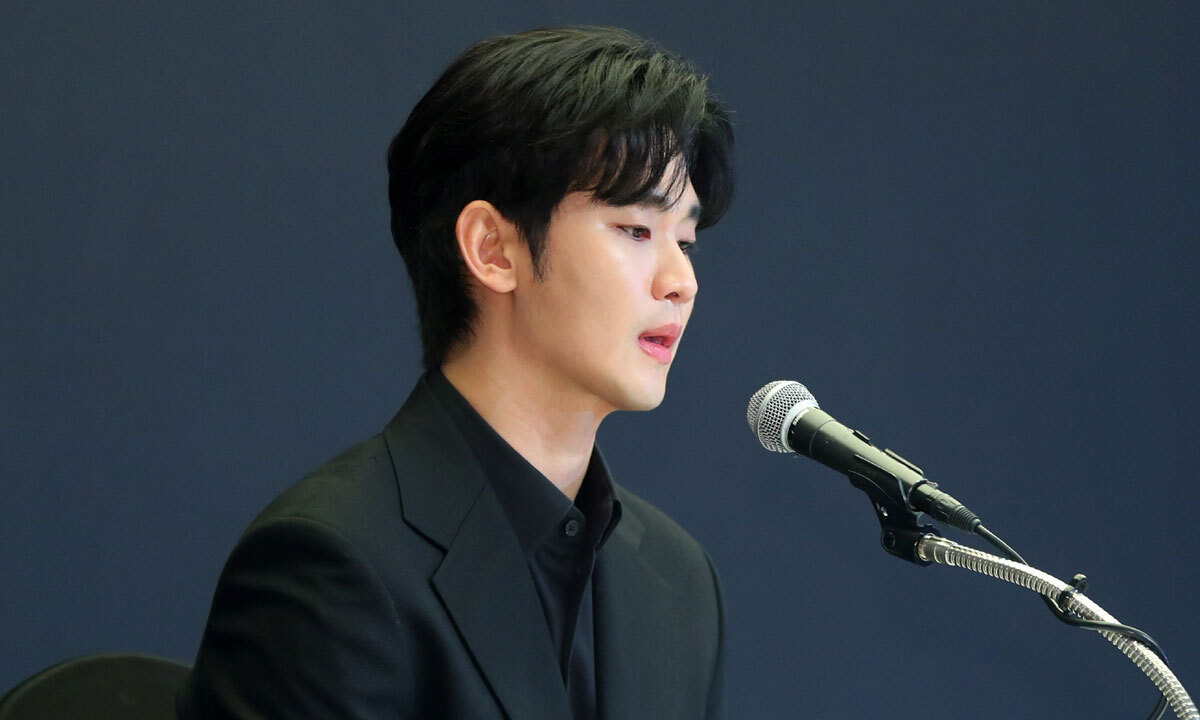프로는 실력으로 말한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 스스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내야수 전민재(롯데)도 그렇다. 올 시즌 날개를 피고 있다. 21일까지 24경기에 나서 타율 0.397(73타수 29안타)을 마크했다. 이 기간 규정타석 기준 손아섭(NC·0.422) 다음으로 높다. 4월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0.440까지 올라간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면모를 자랑 중이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전민재는 2018 신인드래프트 2차 4라운드(전체 40순위)로 두산 지명을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수·주 삼박자를 고루 갖춘 내야수로 주목 받았다. 한화의 1차 지명 후보로 이름을 거론될 정도였다. 프로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주로 백업으로 뛰었다. 출전 경기 자체가 적다 보니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가능성을 보인 것은 지난해다. 데뷔 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경기(100경기)에 나서 타율 0.246(248타수 61안타) 2홈런을 때려냈다.

전환점이 된 것은 트레이드다. 전민재는 지난해 11월 롯데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투수 정철원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었다. 2022년 신인왕 출신인 만큼, 기대치가 높았다.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었다. 보여주면 된다. 전민재는 묵묵히 구슬땀을 흘렸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다. 스프링캠프 내내 여러 포지션에 기용하며 테스트했다. 시범경기에서도 좋은 흐름(5경기 타율 0.300)을 보인 끝에 개막 엔트리에 드는 데 성공했다.
사실 롯데 내야진은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는 상태였다. 전민재는 백업으로 출발했다. 영원한 주전도, 영원한 백업도 없다. 지난 시즌 풀타임 유격수로 뛰었던 박승욱이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 속에 2군으로 향했다. 2루수 고승민과 3루수 손호영은 각각 내복사근, 옆구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김 감독은 그때마다 가장 먼저 전민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란 듯이 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신바람을 냈다.
전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롯데도 ‘진격’ 모드를 켰다. 4월 17경기서 11승6패를 작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월간 승률 0.647, LG(11승5패·0.68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월 8경기서 2할대 승률(0.286·2승1무5패)에 그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살아났다. 4월 팀 타율 0.309로 리그 1위다. 롯데의 색깔이 살아난 것. 무엇보다 팀 전체에 긍정적인 긴장감이 감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선의의 경쟁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